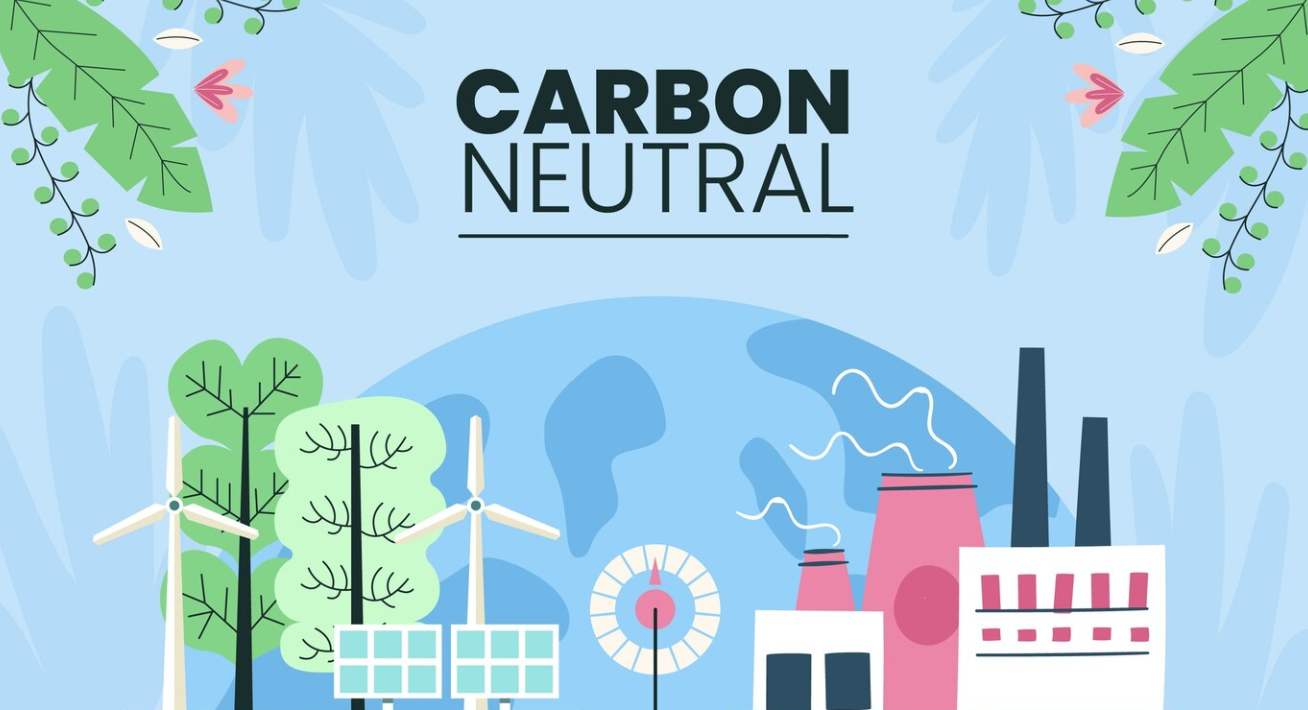
CCUS 및 관련 환경 규제
국내외 환경 규제 동향
- 미국:
- LNG 개발 확대와 함께 탄소세 부과 논의 지속.
-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을 통해 CCUS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(45Q) 강화. 최대 85달러/톤(CO₂ 저장) 및 60달러/톤(CO₂ 활용) 지원.
- 지역별 CCUS 허브 개발 가속화, 예: 텍사스 걸프만 지역 대규모 저장소 프로젝트.
- 한국:
- 2024년 1월 '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'(CCUS 법) 시행.
-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US 실증 프로젝트(2.95조 원 규모)가 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.
- 2030년까지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,030만 톤에서 1,120만 톤으로 상향 조정(2023년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).
- 202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(ETS) 강화 및 탄소세 도입 검토.
- EU:
- 2023년 10월 탄소 국경조정제도(CBAM) 시행 시작, 2026년 본격 적용. 철강, 시멘트, 알루미늄 등 고탄소 산업 대상.
- 2030년까지 CCUS를 통해 5,000만 톤 이상 CO₂ 저장 목표.
- 넷제로산업법(Net Zero Industry Act)으로 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.
- 기타:
- 일본: 2023년 CCUS 로드맵 발표, 2030년까지 1,200만~2,000만 톤 CO₂ 포집·저장 목표.
- 호주: Gorgon CCS 프로젝트 확대, 연간 400만 톤 CO₂ 저장 중.
- 중국: 2025년까지 CCUS 시범 프로젝트 30개 이상 추진, 석탄 화력 중심으로 기술 개발 가속.
- 글로벌: 바이오가스 활용 의무화(영국, 독일), CCUS 기술 국제 협력 강화(ASEAN-한국 CCUS 협력 등).
CCUS 기술 정의
- CCUS (Carbon Capture, Utilization, and Storage)
- CO₂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통합 기술.
- 주요 적용: 화력발전, 철강, 시멘트, 석유화학, 수소 생산.
- 탄소중립과 경제적 가치 창출 동시 목표.
- CCS (Carbon Capture and Storage)
- CO₂ 포집 후 지하(염수층, 고갈된 유·가스전)에 영구 저장.
- 과제: 저장소 확보, 누출 리스크, 높은 초기 비용.
- 진전: 글로벌 CCS 프로젝트 2024년 기준 40개 운영 중, 연간 4,500만 톤 CO₂ 저장(IEA).
- CCU (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)
- CO₂를 화학물질, 연료, 건축 자재 등으로 전환.
- 활용 사례:
- SK에너지: CO₂로 합성연료 생산 시범.
- 포스코: CO₂ 광물화로 탄산칼슘 활용.
- 한계: 활용량 제한, 일부 공정에서 CO₂ 재배 출 가능성.
- CC (Carbon Capture)
- CO₂ 분리·포집 기술(흡수법, 분리막, 심냉법 등).
- 최신 동향: 분리막 기술 상용화 가속(에어레인, Air Liquide).
- CCUS 중요성
- IEA: 2050년 탄소중립 위해 CCUS가 전체 감축량의 15% 기여 예상.
- 한국: 화석연료 의존도 높은 산업 구조상 CCUS 필수. 블루수소 생산과 연계 강화.
- 국내 과제:
- 저장소 부족(동해 가스전 외 추가 탐사 필요).
- 기술 상용화 비용(포집 효율 90% 이상 목표).
- 법적·제도적 지원 미흡.
최신 동향
- 정부 정책 및 투자
- 2024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CCU 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.
- 2030년까지 CO₂ 활용 제품 시장 1조 원 목표.
- 연구소-산업 연계 플랫폼 구축, 글로벌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.
- 한국 CCUS협회(K-CCUS): 2024년 11월 7~8일 제7차 컨퍼런스 개최. 건설, 철강, 에너지 등 산업별 CCUS 상용화 논의.
- 동해 가스전 CCS 프로젝트: 2027년 연간 100만 톤 CO₂ 저장 목표, 2030년까지 400만 톤으로 확대.
- 2024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CCU 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.
- 국제 협력
- ASEAN: 2024년 말레이시아 Petronas와 'Shepherd CCS 프로젝트' 협력 강화. 한국에서 포집한 CO₂를 말레이시아 저장소로 운송.
- 노르웨이: 2024년 Northern Lights 프로젝트와 기술 교류. 한국 기업(Samsung E&A, GS E&C 등) 참여.
- 미국: SK이노베이션, 텍사스 CCUS 허브와 합작 투자 논의 중.
- 기술 개발 현황
- 포집: 분리막 기술 상용화 가속, 기존 흡수법 대비 비용 30% 절감 목표.
- 활용: CO₂ 기반 합성연료 및 플라스틱 상용화 사례 증가.
- 저장: 동해 가스전 외 울산·포항 해저 저장소 탐사 진행 중.
- 스타트업 중심 소규모 모듈형 CCUS 기술 개발 활발.
- 시장 전망
- 글로벌 CCUS 시장: 2024년 40억 달러 → 2030년 120억 달러 성장 예상(BloombergNEF).
- 한국: 2030년 CCUS 관련 일자리 5만 개 창출, 경제 효과 3조 원 예상(산업통상자원부).
- 투자 리스크: 초기 비용 높고 저장소 불확실성 존재. 장기적으로 탄소세·CBAM 대응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.
전망
- 강점:
- 정부의 강력한 CCUS 정책 지원(CCUS 법, 세제 혜택).
- 철강·석유화학 등 고배출 산업의 기술 개발 역량.
- 수소 경제와 CCUS 시너지(블루수소 중심).
- 약점:
- 국내 저장소 부족, 해외 의존도 높음(ASEAN 협력 필수).
- 상용화 초기 단계로 비용 경쟁력 낮음.
- 지역 주민 수용성 및 환경 영향 논란(저장소 안전성).
- 투자 관점:
- 장기적 기회: 탄소중립 규제 강화(CBAM, ETS)로 CCUS 기술 수요 급증 예상.
- 단기 리스크: 정책 변화, 기술 불확실성, 글로벌 경기 변동.
- 추천 전략:
- 기술 경쟁력 높은 기업(에어레인, 그린케미칼) 우선 검토.
- 대기업 중심 컨소시엄(포스코, SK, GS) 안정성 주목.
- 수소·CCUS 융합 사업(효성중공업, 두산에너빌리티) 성장성 고려.
- 글로벌 트렌드:
- CCUS 허브 개발 가속화(미국, EU, 호주).
-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확대 → CCUS 경제성 강화.
- 한국은 동아시아 CCUS 리더로 자리 잡을 잠재력 보유, ASEAN 협력 통해 저장소 문제 해결 가능성.
'시사 > 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신용융자잔고, 잔고비율, 공여비율이란? (0) | 2025.04.16 |
|---|---|
| HVDC 송변전설비란? (1) | 2025.04.11 |
| 마진콜(Margin Call)과 반대매매 완벽 정리: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(0) | 2025.04.10 |
| 증권사별 거래원 창구 상세 분석: 증권사별 특징 포함. (1) | 2025.04.08 |
| 주식시장의 안전장치: 사이드카(Sidecar)와 서킷브레이커(Circuit Breaker)란? (1) | 2025.04.07 |